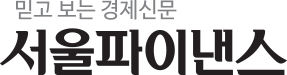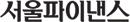野, 조항 제외 패스트트랙 지정···"더 늦추기 어려워"
與 "단기 집중 근무, 생존 직결···업계 목소리 들어야"
반도체 경쟁력 저하에 엇갈린 시선···불확실성 확대
기업 "일할 시간 부족" vs 노동계 "경영진 무능 때문"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반도체 업계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주 52시간 제외'가 발목을 잡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고 자유롭게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제외' 조항을 특별법에서 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제외' 조항에 대한 갈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만큼 더 늦추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제외' 조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 내용이 담겨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계획 임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 제외'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반올림 등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는 한국을 다시 세계 최고 ‘과로 국가’로 되돌려 놓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반도체 산업의) 연구노동력이 필요하다면, 무능한 경영을 한 경영진의 임금을 삭감해서 인력을 추가 채용하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제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화성의 한 반도체 기업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 예외를 두고 필요할 때 단기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게 기업의 생존과 관련한 부분이라는 것을 절절히 들었다"며 "'주 52시간 예외'가 안 되면 말 그대로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화두가 된 '주 52시간 제외'는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연구원과 개발자들이 신기술 R&D에 매진해기 위해 수개월간 집중해야 하는데 주 52시간 규제가 제약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 차원의 반도체 인프라 조성 등 투자 활성화 지원, 첨단 반도체 R&D 및 반도체 생태계 강화 지원, 주 52시간제 완화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완만히 협의돼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주 52시간 상한제는 반도체 경쟁력 저하를 가져왔는가?
'주 52시간 제외' 조항의 쟁점은 근로기준법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됐는지 따져야 한다. 우리나라 반도체는 D램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지키고 있지만,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대만의 TSMC와의 경쟁에서 밀린 데다 주력인 D램 분야에서도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매섭게 추격해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D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매출 112억5000만 달러(약 16조2225억원)로 점유율 1위를 지켰다. HBM3E 출하량 증가세를 앞세운 SK하이닉스는 104억6000만 달러(약 15조833억원)로 2위를 차지했다. 전체 D램 시장 규모는 280억 달러(약 40조476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9.9% 늘었다.
파운드리는 지난해 3분기 기준 TSMC가 64.9%로 1위, 삼성전자가 9.3%로 2위를 지켰다. D램 시장에서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최근 5년새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CXMT는 최근 2세대 HBM인 HBM2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과 HBM 기술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계에서는 "연구·개발진들이 연구에 매진할 시간이 없어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이 경쟁력 저하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AI 반도체 붐이 일면서 빅테크 간에 경쟁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적기에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데 R&D와 생산 영역에서 주 52시간에 가로막히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권환 SK하이닉스 HBM융합개발 부사장도 최근 자사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HBM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은 기본이고 최상의 제품을 적시에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주력으로 생산될 12단 HBM3E 제품은 기존의 8단 HBM3E 제품에 비해 공정 기술의 난이도가 높다"며 "차세대 HBM 제품은 진화하는 제품 세대에 따라 기술적인 과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두고 봐도 SK하이닉스는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간 반면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실적 내리막길을 걸었다"며 "똑같이 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도 결과가 엇갈린다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의 역량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